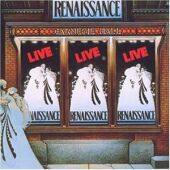 |
발표 연도: 1976 Annie Haslam: vocals, percussion John Tout: keyboards, vocals Jon Camp: bass, guitar, vocals Michael Dunford: guitar, vocals Terence Sullivan: percussion, drums, vocals New York Philharmonic Strings New York Philharmonic Horn |
Renaissance – Sight & Sound Live at BBC – 1977
01 – 01:00 – Carpet of the Sun
02 – 05:18 – Mother Russia
03 – 16:05 – Can you hear me
04 – 29:22 – Ocean Gipsy
05 – 37:28 – Running Hard
06 – 48:14 – Touching Once (Is So Hard to Keep)
07 – 58:36 – Prologue
(이 앨범은 필자가 워낙 좋아하는지라, 좀 심하다싶게 칭찬이 늘어져도 그러려니 하시길 바란다. ^_^ 영상은 다른 공연 실황. 전설적인 Carnegie Hall 의 공연실황의 영상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영상의 공연도 이들의 최전성기의 퍼포먼스를 감상할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할따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전설의 그룹 야드버드 해체 이후 리드보컬을 맡고 있던 Keith Ralf라는 사람이 1969년 Renaissance라는 밴드를 조직했고 이 밴드가 멤버들을 이리저리 바꾸다 보니 처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 다시 구성이 되었는데, 1972년 ‘Prologue’가 이 새로운 르네상스의 본격적인 데뷔앨범이 될 것이다. (두장의 앨범을 발표한 오리지널 르네상스의 음악도 영 나쁘진 않지만… 워낙에 휘황하게 빛나는 새로운 르네상스의 빛에 가려서 초라해보인다.) 비록 80년대 들어서 매너리즘에 빠진 맥빠진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포크와 클래식을 주된 양념으로 한 70년대의 ‘Ashes are burning’, ‘Scheherazade and other stories’, ‘Turn of the cards’ 등 일련의 맛깔스러운 명반들은 분명 경청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 ‘Live at Carnegie’는 그 스튜디오 앨범들의 명곡들이 한데 모였다는 것 뿐 아니라, 온몸이 떨리는 라이브의 감동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훌륭하다. 몇 손가락 안에 꼽아주어도 괜찮을 라이브 명반이 아닌가 생각한다.
‘Ocean gypsy’는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데, 너무 팝 발라드스럽다면서 싫증내는 분들도 있지만, 필자는 들을 때마다 가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 것만 같은 감흥에 젖는다. Annie Haslem – 그 목소리는 이러니 저러니 설명이 필요없다. 백문불여일청!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라면 이런 목소리를 얘기하는 것을 터. 클래시컬하게 들려서 원래 성악을 공부했던 사람인가 싶지만, 그렇지는 않다. 나중에 오페라 가수에게 배우기는 했다고… Annie의 목소리는 그저 청아하고 아름다운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화려하고 힘찬 John Tout의 피아노 및 건반 연주, – 그는 르네상스 사운드의 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기타리스트 Mike Dunford의 뛰어난 작곡과 완벽하게 결합되어 르네상스 사운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Carpet of the sun’에서부터 ‘Scheherazade’에 이르기까지는 New York Philharmonic이 같이 연주하는데, 르네상스의 연주와 완벽한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연주를 적절히 받쳐주면서 웅장한 스케일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28분의 초대형 야심작 ‘Scherazade’가 끝날 즈음에는 관중의 엄청난 열광을 함께 느끼게 된다. 아, 살떨리는 감동의 명연, 그 현장에 있는 것이다!
역시 22분이 넘는 대곡 ‘Ashes are burning’에서는 John Tout와 함께 르네상스 사운드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해야할 Jon Camp의 느닷없는 베이스 솔로, 그 다음에는 거의 스윙감마저 느껴지는 재즈적인 애들립이 이어지면서 허를 찔린 듯한 기분이다. 하지만, 르네상스는 자기네들 음악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는 치밀한 밴드인지라 길을 잃고 헤메이는 법은 없다. 곧 다시 제길로 돌아오면서 숨막히는 듯한 피날레로 청중들을 몰고간다. (끝부분의 연주가 좀 너무 길게 늘어지는 듯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다른 곡들도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뛰어난 곡들이지만 지저분한 해설은 그만 삼가해야 할 듯하다.
락 음악이란 대개 우아함, 고상함, 이런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거칠고, 공격적이고, 과격하고 파괴적인 것이 보통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이다. ‘아트락’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실제 아트락을 한다는 밴드들의 음악을 듣고 받는 감흥이란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예술’의 이미지, – 물론 편협한 스테레오타입이지만 – 즉, 고전주의 그림이라든지, 곱고 단아한 현악 사중주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고고한 아름다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헌데, 여기 잔잔한 호반을 미끄러지는 백조처럼 우아한 락 밴드가 있다. (백조들이 노는 꼴을 가까이서 보면 전혀 우아하지 않다는 설도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야말로 ‘예술적인’ 락이다. 동그란 네모라고 할까, 아니면, 이들의 대표곡 제목대로 ‘재가 불탄다(Ashes are burning)’고 해야 할까. 포크, 클래식, 심지어는 재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쟝르의 음악들과 락을 절묘하게 비벼놓은 비빔밥, 파라독스에 가득찬 그 고급스럽고도 기막힌 맛을 필자는 무척 좋아하고, 또 그들의 여러 주옥같은 (주옥이 어떻게 생겼나 잘은 모르지만서도) 명반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내공과 외공의 기를 한데 모아 터뜨려버린 한마당 대박 잔치는 역시 이 ‘Live at Carnegie’라고 생각한다.
사족 하나 – 락 컨서트로는 좀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한데, Annie Haslem과 Mike Dunford(일 것이라고 짐작. 정확히는 모르겠음)가 사이 사이 주절 주절 곡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다. 뭐 특별히 분위기를 잡치는 수준은 아니다.
사족 둘 – ‘Ocean gypsy’ 도중에서도 그렇고, 세부분으로 이루어진 ‘Scheherazade’의 두번째 파트가 끝났을 때도 그렇고 관중의 성급한 박수가 미리 터져나온다. 필자는 클래식 컨서트에 가서 모르는 곡이 나오면 (대개 그렇지만!) 최대한 보수적이 되어 가장 늦게 박수를 치는 사람이 된다. 르네상스의 컨서트라면 맘 놓고 제일 먼저 박수 치기 시작할텐데. 어디가 끝인지 아니까!
2001. 3. 27.